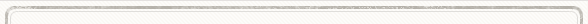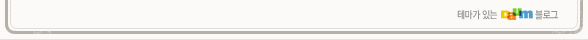저자 : 신영복
카테고리 : 시/에세이
책소개 : 우리시대의 참된 스승 신영복의 베스트 서화 에세이...

출판사 서평
신영복 교수의 글을 읽다 보면 그 글이 아주 길거나 짧더라도 어김없이 긴 여운을 남기는, 혹은 되풀이해서 자꾸만 읽게 되는 글귀를 만나게 된다.
이 책은 그동안 발표된 신영복 교수의 글 중에서 삶을 사색하고, 뒤돌아보고, ‘더불어’ 체온을 느끼게 하는 글들을 그림, 글씨와 함께 엮은 것.
1부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어린 새처럼’은 사랑과 그리움, 삶에 대한 사색, 생명에 대한 외경 등에 관한 글을 담았고,
2부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은 관계, 더불어 사는 삶, 우공이산 같은 인생의 우직함 등에 대한 글을 모았고,
3부 ‘늘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에서는 성찰, 세계관, 결국은 사람, 그리고 희망에 대한 글을 모았다.
따뜻한 시선과 깊은 사색이 담긴 글로 묵직한 감동을 안겨주는 우리 시대의 참스승, 신영복 교수의 글을 통해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인간이고
, 또 인간답게 사는 일이어야 한다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힘든 세월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글로써 또 다른 부담을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독자들에게 단호한 결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다보면 단호한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가 하면, 우연한 깨달음이 튼튼한 기둥으로 자라 좋은 삶을 지탱시켜줍니다.
저는 글에서 우연한 깨달음의 여백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내 글에서 독자들이 나의 생각에 심취하기보다 자신들의 생각에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각자의 잠재의식까지 읽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일에 있어서도 항상 70%만 채우고 나머지 30%는 여백으로 남겨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글에서 남겨진 30%의 여백은
독자의 몫입니다. 이 여백을 통해 독자와 나의 창조적 공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중에서...
처음처럼(표제작)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그리고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야심성유휘(夜深星逾輝)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는 사실보다 더 따뜻한 위로는 없습니다. 이것은 밤하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어둔 밤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옷이 얇으면 겨울을 정직하게 만나게 되듯이 그러한 정직함이 일으켜 세우는 우리들의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너른 마당
너른 마당이란 대문이 열려 있는 마당입니다. 대문이 열려 있으면 마당과 골목이 연결됩니다. 그만큼 넓어집니다. 그러나 열린 마당은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소통과 만남의 장(場)이 됩니다. 사람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연초록 봄빛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양지의 풀밭이나 버들가지가 아니라 무심히 지나쳐 버리던 솔잎이었습니다. 꼿꼿이 선 채로
겨울과 싸워온 소나무 잎새에 가장 먼저 봄빛이 피어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만 잊고 있었을 뿐,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가 됩니다
바다는 모든 시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물입니다.
바다가 물을 모우는[能成其大] 비결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데에 있습니다. 연대(連帶)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물과 같아야 합니다.
낮은 곳, 약한 곳으로 향하는 하방연대(下方連帶)가 진정한 연대입니다.
나무야 나무야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생각하는 나무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더불어 한길
배운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손 내 손
네 손이 따뜻하면 내 손이 차고, 내 손이 따뜻하면 네 손이 차다. 우리 서로 손 맞잡을 때. 손잡는다는 것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체온도 따뜻한 손에서 찬 손으로 옮아갑니다.
여름 징역살이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케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 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나아가면서 길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가면서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길을 만들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도 동시대의 평범한 사람들과 더불어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인하여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럿이 함께
‘여럿이 함께’라는 글 속에는 방법만 있고 목표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함께’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는 목표에 이르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목표 그 자체입니다.
여럿이 함께 가면 길은 뒤에 생겨나는 법입니다. 먼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로부터 당면의 실천적 과제를 받아오는 이른바 건축의지(建築意志)는
거꾸로 된 구조입니다. 목표와 성과에 매달리게 하고 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단화하고 황폐화합니다. 설계와 시공은 부단히 통일되어야 합니다.
‘여럿이 함께’는 방법이면서 목표입니다.
고독한 고통(苦痛)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까닭은 그것을 혼자서 짐 져야 한다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인칭의 고독이 고통의 본질입니다.
여럿이 겪는 고통은 훨씬 가볍고, 여럿이 맞는 벌은 놀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는 방법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릇을 깨트리고
성공은 그릇이 가득 차는 것이고, 실패는 그릇을 쏟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공은 가득히 넘치는 물을 즐기는 도취임에
반하여, 실패는 빈 그릇 그 자체에 대한 냉정한 성찰입니다. 저는 비록 그릇을 깨트린 축에 속합니다만, 성공에 의해서는 대개 그 지위가 커지고,
실패에 의해서는 자주 그 사람이 커진다는 역설을 믿고 싶습니다.
인간주의
새로운 인간주의는 자연으로부터의 독립도 아니며, 궁핍으로부터의 독립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쌓아 놓은 자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며,
무한한 욕망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어제가 불행한 사람은 십중팔구 오늘도 불행하고, 오늘이 불행한 사람은 십중팔구 내일도 불행합니다. 어제 저녁에 덮고 잔 이불 속에서 오늘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어제와 오늘 사이에는 ‘밤’이 있습니다. 이 밤의 역사는 불행의 연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밤의 한복판에 서 있는 당신은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을 위하여 꼿꼿이 서서 밤을 이겨야 합니다.